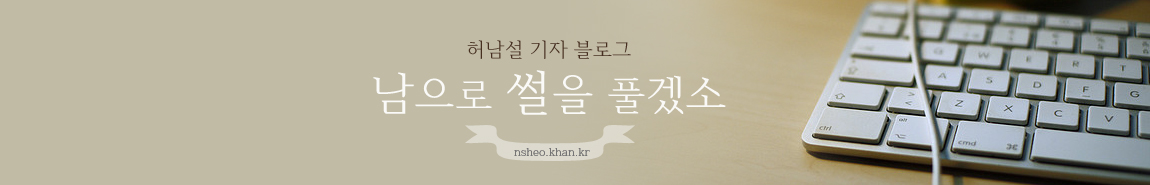24.19㎡. 서른살이 돼 처음 자취를 시작한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넓이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의 내 방보다 작다.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제거됐다. 책상, 책장, 옷걸이, 오디오 등등. 여기에 살면서부터는 철저한 ‘기능주의자’가 됐다. 의자는 사람이 앉기 위한 크기면 충분하고, 식탁과 책상은 따로 마련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물의 제 의미를 찾아준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 아니, 식탁은 책상이 되기도 하면서 의미가 더 풍부해졌다. <작은 집을 권하다>는 대략 이런 내용이다.
일본인 저자가 쓴 이 책은 ‘스몰하우스’(Small House)에 대해 설명한다. 3평(약 10㎡) 정도의 작은 집에 거주하는 6명을 취재해 쓴 책이다. 물론 저자도 스몰하우스에 산다. 어느 산 깊숙이 버려진 듯한 아주 보잘 것 없는. 삽도로 실린 그의 집을 보면 누구나 ‘일본인들은 역시 참 괴짜군’이란 생각이 들 거다. 미국과 호주에 거주하는 그의 취재 대상들이 사는 집은 좀 다르다. 그것은 얼핏 보기엔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 생산한 주택처럼 엇비슷하게 깔끔하다. 주목할 것은 외관이 아니라 그 속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많은 이들이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무리가 없는 작은 집을 갖자”고. 책에 등장하는 사례에는 주택 융자에 치이다가 결국 작은 집을 갖게 됐다는 사람도 있다. 다른 부류도 있다. 도시에서 그럴 듯한 전문직을 갖고 있지만, 본인 나름의 철학으로 인해 일부러 작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들은 입을 모아 증언한다. 작은 집이 마음의 평안을 갖게 했노라고, 저자는 이를 ‘개인정신주의’라 부른다. 이어 스몰하우스 운동의 의의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작은 집에 살다보면 결국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마르 알렉산더의 작은 집. 모두가 전원일기를 쓰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럴 것 같다.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 땅에 그만큼 낭비는 줄어들 것이고, 지구는 좀 덜 아플 거다. 스몰하우스 운동의 의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물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그가 내린 답은 스몰하우스 운동의 실행자들보다 가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를 읽었을진대 세상은 ‘크기’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
왜 그러냐고? 모르겠다. 아는 것은 이 책이 제시하는 스몰하우스 운동에 많은 한계와 난관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는 거다.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싱글 혹은 2인 커플이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 적절한 스몰하우스의 모델은 보이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작은 집이 한적한 시골에 자리잡았다. 스몰하우스의 도시적 모델은 언급되지 않는다. 과연 이 많은 인구가 너른 들판과 산골짜기 곳곳에 스몰하우스를 짓고 사는 것은 친환경적인가. 모두가 전원일기를 쓰고 있을 수는 없다.
저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심지어 황당하기까지 한다. “식량을 비축해두기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마켓에서 사다 먹는 게 더 좋다. 언제 입을지 모를 옷가지들을 상자에 넣어 쌓아두기보다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기분에 가장 잘 맞는 옷을 구입하는 게 낫다”, “식사는 얼마든 밖에서 할 수 있고, 세탁이 필요할 때는 동전 빨래방을 사용하면 된다. 공공도서관은 자기만의 거대한 서가가 된다” 등등. 그 고결한 ‘개인정신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나를 탓해야 하는 걸까.
니가 사는 그집
'건축과 졸업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람 대신 벌을 받는 집 (0) | 2015.01.30 |
|---|---|
| 약하지만 깊은 건축 (1) | 2015.01.29 |
| DDP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다 (4) | 2014.03.27 |